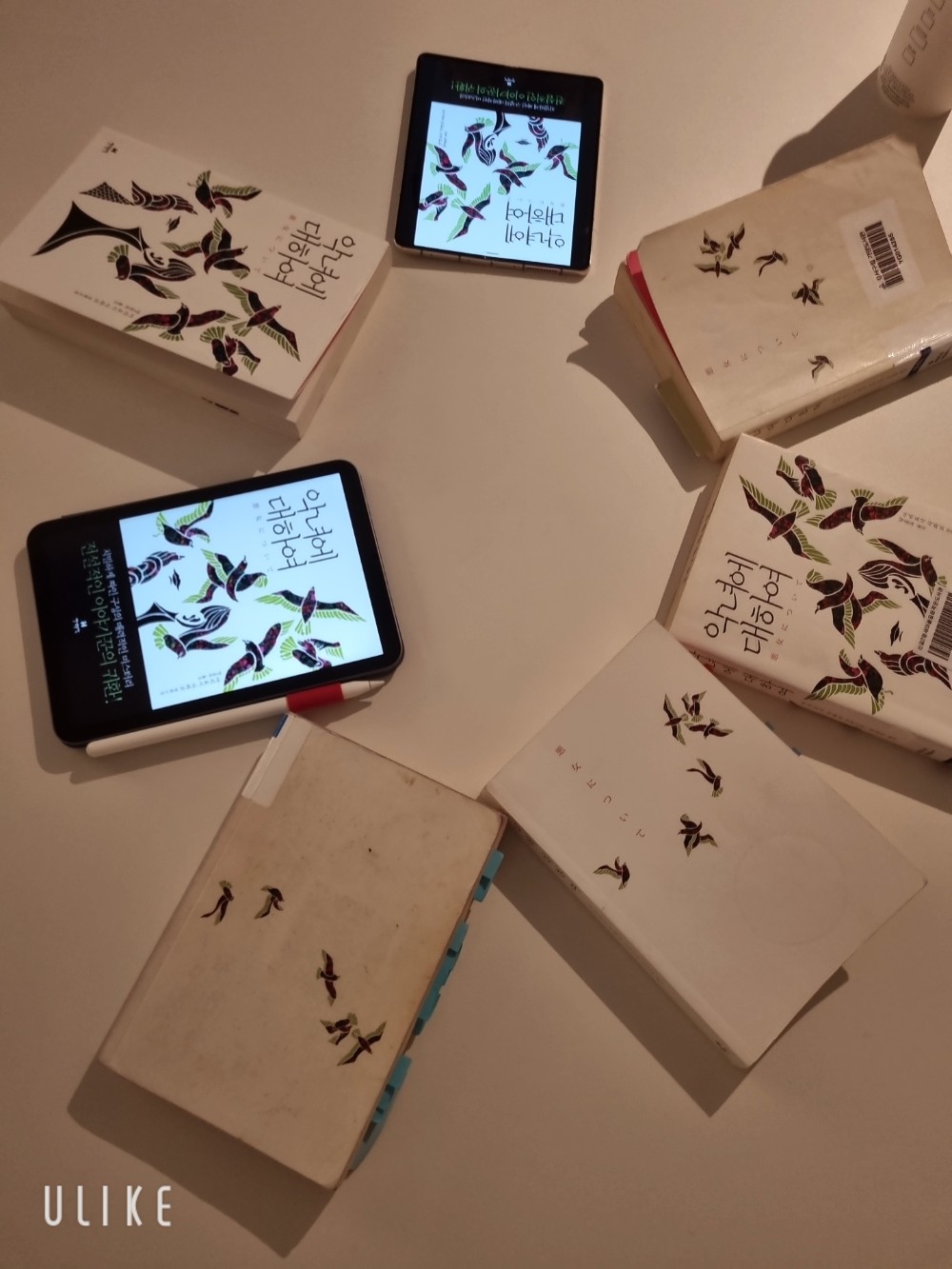유사한 배경을 가진다는것, 어린 시절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본인이 아직 사회의 때가 묻지 않았을 때의 기억을 공유하는 주변 인물들을 생각해보자. 학창시절 친구들이 주가 되겠지.
정말이지 희한하다.
내가 다소 엉뚱한 생각을 표현하거나 심지어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그들에게는 이해받고 이미 용서받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인지 말로써 제대로 서술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겠다.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 저기 다중의 가치들과 혼란속에 얼룩진 지금의 나보다는 그 때의 내가 “진짜 나"여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 때의 진짜 모습들을 서로 공유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내가 나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시절에, 친하고 깊었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지 진득한 관계가 아니었던 친구나 지인과도 거의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너는 도대체 왜그러냐 이 x꺄"와 같은 말을 지금 내가 그들에게 한다고 해도, 딱히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을 안다. 오히려 형언하기 어려운 자신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들이 당장 나의 이런 생각이나 글에다 대고 “아주 그냥 ㅈㄹ을 하고 있네 이거..”와 같은 표현을 한다고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다. 아니,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미묘한 따뜻한 느낌마저 들지도 모르겠다.
나의 모자람일 수도 있다.
얼음이 되었다가 강물이 되었다가 물총 속의 물도 되었다가 라면 끓이는 물도 되었다가.. 이런 태도라면 이것들은 모두 함께 H2O로서 공통된 본질을 일부는 공유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그저 나는 얼음이오.”, “난 라면용 물일 뿐이오.”와 같은 자세로 살게된 까닭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물론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사실은 매우 중요치는 않다.
인간 관계도 “화학적 결합"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하는 것 같다.
“물리적 접촉"만이 주를 이루는 관계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마치 로또 추첨통 안의 공들처럼 수없이 팅팅팅 맞부딪치긴 해도 결국 너는 너고 나는 나로 끝나고 마는 것 아니겠나.
본질을 나눠본 지인, 친구만이 진실된 인맥이고 나머지는 쓸데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인생 초반인 이 나이에서, 앞으로의 인생은 새로 알게 되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서로 화학적 교류를 하고 본질을 나누는 사귐을 할 수 있길 바라본다.
그럼으로써, 위에 말한 정도의 상호 이해도를 갖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냉장고 안의 “친한 듯하지만 실상은 서로 뻘줌하게 서있는” 그런 음료수 페트병들 같은 관계가 되지는 말자.
내일(아니 오늘)은 공교롭게도 금요일이라, 더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이 다짐을 실천할 수 있겠구나.
쿨쿨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문득 정신이 슬며시 깬 상태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찾아와 굳이 글로 남긴다.
Back to sleep!
'나를 찾아오는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가 생각하는 독서의 의미와 목적(221026) (2) | 2023.01.07 |
|---|---|
| 나에 대한 확신의 성장 (0) | 2010.04.08 |
| 믿음과 신뢰의 불필요성이 성립하는 경우 (0) | 2010.04.02 |
| '새로움'에 대하여.. (0) | 2010.04.02 |
| 돌고기 (0) | 2010.04.02 |